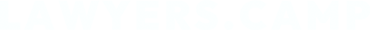기출문제 2018년도 추리논증 1번
페이지 정보

본문
|
1. A~C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제한된 2분 안에 문제를 푸신 분도 계시고, 풀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전체 운영 면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120초라는 시간은 해당 ‘대응형 문제’의 경우, 문제 해결에 충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학생분들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셨다면, ‘자가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① 내가 어떠한 문장 부분에서 시간이 남들보다 지연되었는가, ② 불필요한 사고 과정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③ 그 오류가 어떠한 연유로 발생하였는가를 항상 분석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사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투입했네.’라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 사고의 교정작업을 즉각적으로 진행하여, 스스로 깨달음과 각인의 순간, 교정의 과정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축적을 해 나가는 것이 적성검사형 시험에서 본질적 영역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보죠.
당장은 좀 와 닿지 않더라도 해당 부분에 밑줄을 쳐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X국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 |
제가 이 문제를 시험장 현장에서 받아들었을 때, 첫 번째 문장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의 ‘갖고서’에 밑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장이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by’나 ‘with’ 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에서 수단과 방법이라는 의미를 전치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친 것이었습니다. 토익 시험이라면 누구나, 미리(already)와 같은 부사나, by, with, without과 같은 전치사를 통해서 시간, 장소, 관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갖고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오면 ‘갖고서’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지라는 부분을 다시 보게 되겠죠.
영어에서 전치사를 통해 형식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Whenever S + V |
S+V와 관련된 절은 항상 S가 V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네 ⇛ always로, 즉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겠네 |
|
Without / with, S+V |
전치사 뒤에 있는 요소와, S는 V하는데 관계가 없/있 겠구나 -> 그런 서술이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겠네 |
|
“다른 단어로 페러프레이징된다면, 나는 해당 문장의 이 표현, 이 구절에 와서 대응해야지”
⇛ 행동요령으로는 따라서 다시 돌아오기 편하기 위한 장치를 밑줄 등을 통해 만들어야지! |
|
영어 문법 시험이나 영어 독해 시험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밑줄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학적성시험 역시도, 객관화된 시험이기에 형식적인 요소들이 문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는 사실 고맥락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적성형 시험에 접근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논증 문제의 정답 판별기준은 맥락적인 요소가 아니라 형식적인 요소로서 객관적인 요소들입니다.
|
X국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모든 행정 영역에서 행정의 내용을 법에 미리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행정 영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에 관해 견해의 다툼이 있다. |
그 다음, ‘모두’, ‘한하여’, ‘법으로써’에 줄을 쳤습니다. ‘모두’에 줄을 친 이유는 논의의 평면을 구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라는 단어는 전부를 의미하므로, 문제 속에서 제시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경우, 일부라는 예외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논의의 영역만 존재한다는 사고의 스위치를 한번 껐다, 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논의의 평면이란 논의를 하게 되는 공간에서 전부와 일부라는 구획을 짓는 형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한하여’는 상위 논의와 하위 논의를 구획짓는 ‘차원’ 이라는 형식적 장치를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상위 차원과 하위 차원을 구획하는 표지들은 당연하게도 A의 B라는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① 남성과 여성 역시 사람 중에서도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이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②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등과 같은 구획도 그러합니다. 즉, 앞에 있는 수식어들을 통해서 상위차원의 개념들이 하위 차원의 개념들로 구획됩니다.
<A의 B 표현을 통한 상위차원과 하위차원의 구획 예시>
|
상위차원 (B) |
|
|
하위차원 A의 B |
하위차원 ~A의 B |
|
사람 |
|
|
남자인 사람 |
여자인 사람 |
|
권리 |
|
|
국민으로서의 권리 |
인간으로서의 권리 |
|
법학 |
- 이전글제1강 01 차원 23.09.19
- 다음글2018년도 추리논증 2번 23.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